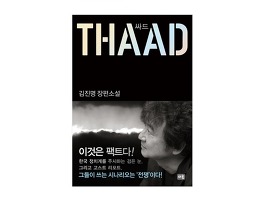그래도 사랑에 관해서라면, 발밑까지 타들어갈지언정 길고 긴 꿈을 꾸고 싶다
#. 01
꿈을 꾼다. 어떤 날은 무슨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도무지 떠올려지지 않는 꿈도 꾼다. 그래도 좋았는지 나빴는지 혹은 이도 저도 아닌 꿈이었는지는 알 수 있다. 기묘하게도 꿈의 잔상은 어렴풋하게나마 남는 것이다. 나는 그 점을 무척이나 진지하고도 신기하게 여겨왔다. 그런 날에는 온종일 희미한 기억 사이에서 전해지는 꿈의 뒷맛을 다시며 그것에 메여있기 일쑤다.
#. 02
은희경의 『그것은 꿈이었을까』에 등장하는 '준'은 꿈속에서 한 여자를 만난다. 그리고 친구 진과 함께 방문한 고시원 레인 캐슬에서 묘령의 여인과 마주한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자신을 만나러 오는 여인, 그렇게 이 소설은 시작된다.
#. 03
진에게 비틀스는 환각이다.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해줄 매우 유용한 삶의 환각제. 준은 바둑 채널을 켜 두는 것으로 족하다. 바둑판을 비추는 단조로운 화면과 나직한 음성만으로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방식의 차일 뿐 그게 그거 아닌가 싶다. 아닌 게 아니라, 때때로 혼자인 시간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땐 라디오를 스위치를 켠다. 허공에 대고 웅얼거리는 타인의 목소리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다.
#. 04
사방이 온통 희뿌옇다. 몽환적이다. 아홉번째 꿈을 꾸기 직전, 준은 안개 자욱한 길 한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었다. 분명 말똥한 상태였는데, 이내 꿈속으로 빠져든다. 준이 그랬듯, 현실 아닌 어딘가를 헤매며 한껏 낯섦을 느낀다.
#. 05
충만한 의식 속의 자아와 무의식 안에서 제멋대로인 자아, 어느 쪽이 '나'란 존재의 본모습인 걸까. 허약하지만 허약하지 않은 자아, 단단하지만 단단하지 않은 자아, 외롭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자아…. 현실의 자아와 꿈속의 자아가 수없이 교차되며 그 경계가 무의미해져 버렸다. 익숙하지만 어딘지 익숙지 않은 낯선 자아를 만나는 일도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므로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 06
나란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우쳤는가 혹은 깨우치지 못해 차라리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가, 어느 쪽인가. 어쨌거나 꿈은 꿔야만 한다.
#. 07
초판 작가의 말에 이렇게 적혀있다. "나는 이 소설을 고독에 관한 이야기로 쓰기 시작했다. 고독한 사람의 뒤를 쫓아가보니 그의 발길이 사랑으로 향했다. 그래서 고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 같다."라고. 지금 내 삶의 한 축이기도 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봤다. '고독'과 '사랑', 역시나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사라지고 싶어했어요. 모두가 수련을 했죠. 몸은 거기 있지만 몸을 뺀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에 삶을 갖고 가서 자신이 꾼 꿈속에서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깨친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의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죠. (…) 그럼 자기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잠을 자요. 꿈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존재를 버리지 못한다면 느끼지 않도록이라도 해야죠. (…)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존재란, 텅 비어있잖아요. - p.225, 226
꿈을 꾸지 않게 되면 떨어질 곳도 날아오를 곳도 없어진다. 누군가는 위에서 걷고 또 누군가는 아래에서 걷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반복되는 시간의 평지를 걷는다는 점은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걷다보면 죽음과 만난다. - p.275, 276
* 미니북을 읽은 것이므로, 페이지가 상이할 수 있음.
 |
그것은 꿈이었을까 -  은희경 지음/문학동네 |
'별별책 > 201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 이기호 | 마음산책 (0) | 2016.05.05 |
|---|---|
| ふわふわ(후와후와) | 村上春樹 | 講談社 (0) | 2016.04.29 |
| 모멘트 | 더글라스 케네디 | 밝은세상 (0) | 2016.04.16 |
| 채식주의자 | 한강 | 창비 (0) | 2016.04.10 |
| 싸드 | 김진명 | 새움 (0) | 2016.03.27 |
| 자기 앞의 생 | 에밀 아자르 | 문학동네 (0) | 2016.03.22 |
| 모모 | 미하엘 엔데 | 비룡소 (0) | 2016.03.13 |
| 숲 | 할런 코벤 | 비채 (0) | 201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