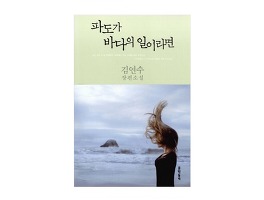미소 없이 상냥하고 서늘하게 예의 바른 위선의 세계,
무서운 것도, 어색한 것도, 간절한 것도 '없어 보이는'
삶에 질기게 엮인 이 멋없는 생활들에 대하여
표지 한 편으로 가지런히 열 맞춰 놓인 활자 '상냥한 폭력의 시대'를 눈으로 읽으며, 무심코 그런 생각을 했다. 상냥한데 폭력적이라니…?? 하지만 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알게 모르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상냥함을 가장한 폭력의 아이러니를 겪어오지 않았던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임을 머리보다는 가슴 깊숙이에서부터 이미 수긍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이리라.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니, 책을 펼치는 것에 덜컥 겁이 났다. 어쩐지 그간 애써 외면해왔던 혹은 가까스로 담담하게 맞닥뜨려왔던 어떤 상황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섰던 이유다.
정이현의 『상냥한 폭력의 시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편의 서늘한 공기를 저편의 소설 속 현실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고대로 옮기고 있다. 무심한듯 적어 내린 짧은 호흡의 문장 안에서 그려지는 풍경은 현실보다 더 현실인 것만 같아, 그 적나라함에 등골이 오싹해지기까지 한다. '작가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시대인 것만 같다. 예의 바른 악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놓으면 손바닥이 칼날에 쓱 베여 있다. 상처의 모양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누구든 자신의 칼을 생각하게 된다.'라 적고 있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너무도 이해가 돼서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것은 비단 나뿐이었을까.
「미스조와 거북이와 나」의 희준, 「아무것도 아닌 것」의 지원과 미영, 「우리 안의 천사」의 남우와 미지, 「영영, 여름」의 와타나베 리에, 「밤의 대관람차」의 양, 「서랍 속의 집」의 진과 유원, 「안나」의 경까지, 7편의 단편에는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제각기인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최악을 모면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각자의 속도로 살아간다. 체념하는 것에 익숙하고, 하찮은 자신의 존재를 자조하며, 우유부단한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책망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하나쯤은 갖고 싶다고 소망하기도 한다. 집이 그랬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 옭아매는 것임을 자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상냥한 폭력의 시대 안에서도 원망하기 위해서, 욕망하기 위해서, 털어놓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안감힘을 쓰며 살아간다.
이들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마치 나의 아프고, 치열했던 그간의 모습을 상기시켜 진한 씁쓸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불가해한 약동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위선의 시대 안에서도 이유가 어쨌든 우리는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결국엔 우리 곁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던 것이다.
나는 그럭저럭 살아간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악을 모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럭저럭, 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 p.10 「미스조와 거북이와 나」
샥샥과 나 사이에, 바위와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줄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천천히 소멸해갈 것이다. 샥샥은 샥샥의 속도로, 나는 나의 속도로, 바위는 바위의 속도로. - p.33 「미스조와 거북이와 나」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미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딸을 부둥켜안고 목 놓아 통곡할 수도 있고,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릴 수도 있었다. 그래도 달라질 게 없었다. 돌려놓을 수 없었다. - p.48 「아무것도 아닌 것」
유리 파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스칠 거라고요. - p.52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아도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죄가 또 유예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하고 절망했다. 극적인 파국이 닥치면, 속죄와 구원도 머지않을 텐데. 또다시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바다 쪽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 p.97 「우리 안의 천사」
나는 오래도록 궁금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대하여 엄마는 무엇을 확인하려 드는 걸까? 나는 엄마가 멀리 놓고 온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끌어모아 내게 들려주려 안간힘 쓰는 그 말들에 대하여. 아직도 엄마의 왼쪽 흉곽 언저리에 박혀 있을지도 모를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대하여. 그것밖에 모르는 아이처럼 나는 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 p.111 「영영, 여름」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나도 단 하나쯤 가지고 싶었다. - p.129 「영영, 여름」
결정의 순간에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결정해버리고, 전 생애에 걸쳐 그 결정을 지키며 사는 일이 자신이 자초한 삶의 방식이라고 양은 탄식했다. - p.111 「밤의 대관람차」
… 이것은 커다란 도미노 게임이며, 자신들은 멋모르고 중간에 끼어 서 있는 도미노 칩이 된 것 같았다. 종내는 모두 함께, 뒷사람의 어깨에 밀려 앞사람의 어깨를 짚고 넘어질 것이다. 스르르 포개지며 쓰러질 것이다. - p.179 「서랍 속의 집」
집을 산다는 것은 한 겹 더 질긴 끈으로 삶과 엮인다는 뜻이었다. 부동산은, 신이든 정부든 절대 권력이 인간을 길들이기 위해 고안해낸 효과적인 장치가 분명했다. 돌이킬 수 없는 트랙에 들어서버렸다고 진은 실감했다.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 - p.184 「서랍 속의 집」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원망하기 위해서, 욕망하기 위해서, 털어놓기 위해서. - p.215, 216 「안나」
 |
상냥한 폭력의 시대 -  정이현 지음/문학과지성사 |
'별별책 > 201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운몽 | 김만중 | 민음사 (2) | 2016.11.26 |
|---|---|
| 편의점 인간 | 무라타 사야카 | 살림 (0) | 2016.11.19 |
| 세계의 끝 여자친구 | 김연수 | 문학동네 (0) | 2016.11.12 |
|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 김연수 | 문학동네 (0) | 2016.10.30 |
|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 앨리스 먼로 | 뿔(웅진) (0) | 2016.10.15 |
| 자존감 수업 | 윤홍균 | 심플라이프 (0) | 2016.10.08 |
| 안나 카레니나(전3권) | 레프 톨스토이 | 문학동네 (0) | 2016.10.01 |
|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 오스카 와일드 | 열린책들 (0) | 2016.09.22 |